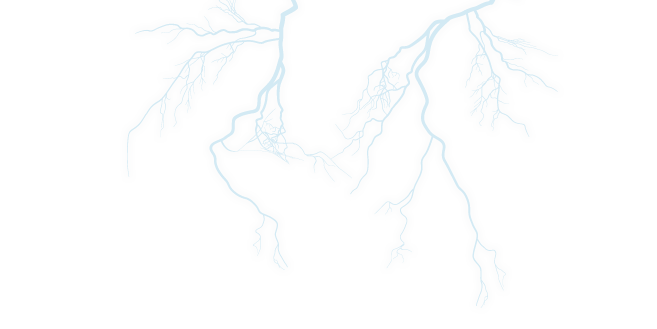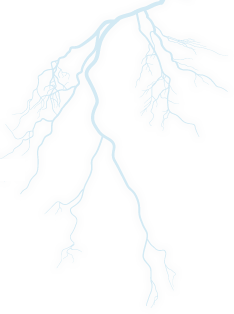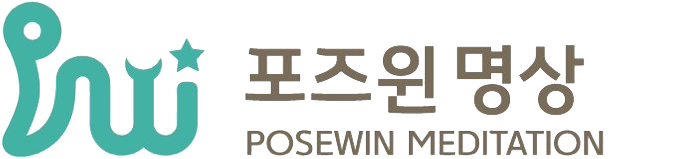일상을 새롭게 3 Renew Posewin 20190814
우리가 느끼는 공허감의 정체는 뇌과학으로
파충류의 외침에 가깝다.
밖을 향했던 인식이 단절되고나면
혼자라는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지는데
이때 감정적 두려움이 파충류의 뇌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자수나 뜨게를 뜨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공허감으로부터 잠시 피해있는것...
밀려오는 공허감을 뭔가 작은 목표에 몰두함으로
내적인 안정을 구하고 있는 것...
누구나 나름대로 잘 나가던 시절이 있다.
이런때에 목적없이 자극만 추구하여 살았다면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공허라고 불리는
무지막지한 공룡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공허감을 느끼는데 있어서 본능을
억누르려는 일방적인 문화적 압박의 시대가
중세였습니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했던
거대한 공허감의 무덤...
중세의 성직자들은 사회를 철저히 통제할
수단으로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본성에는 착함이 있으나 본능에는 착함이 없을 것이고...
결국 본능에는 가치판단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가치판단을 넣으면 힘있는 자들의 자의적
해석이 그 가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공허감의 증가는 사회적인 폭력성이란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중세에는 이같은 위험한 폭력성을 주기적인 공포감
조성과 집단분노의 표출이란 마녀사냥으로 분출시켰습니다.
현대인들은 공허감이 일으키는 폭력성을 심각한 중독으로
급속히 적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깊은곳에서 일어나는 중독의 원인은 파충류 뇌의
외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