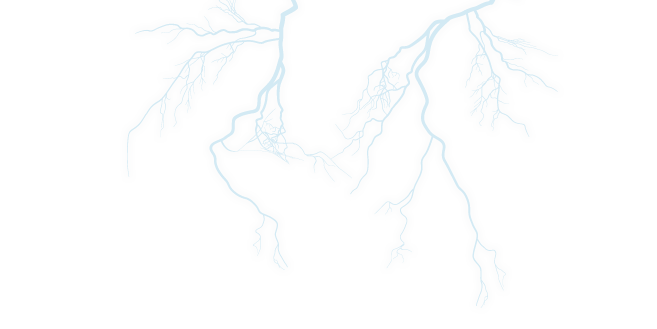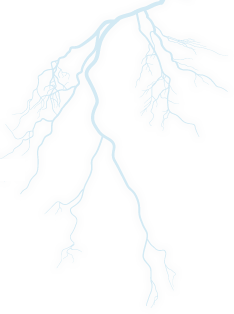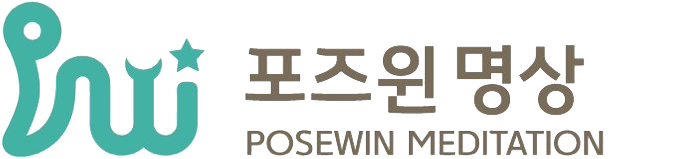일상을 새롭게 3 Renew Posewin 20190927
세상에 적응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권리와 조화이다.
권리는 법 위주이고 조화는 사람위주의
삶이다.
사회가 인간의 양심에 근거한 재량을 뒤로하고
법 위주로 재편될때 사소한것까지 권리과잉
상태가 된다.
결과적으로 양심의 영역보다 큰 법이 촘촘히
만들어지고 사회전체의 동력이 떨어지고
침몰해간다.
중국 역사에 진나라는 법이 사회질서를
주도한 법가주의 사회였다.
생각으론 정의가 바로설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정반대의 사회붕괴로 드러난다.
진나라가 패망한 것은 법이 너무 많아져서
거미줄 위에 자유로운 거미처럼 법위에
소수만이 법에서 자유로울뿐 나머지 사람들은
숨만 쉬어도 법에 질식되는 법가주의였다.
지배층들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위한 세금징수 아니면 허접한
정의론에 근거한 감정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졌다.
가혹하고 박멸에 가까운 인신처벌이 유행했고
그것은 늘 정의로 포장되었다.
그제 뉴스를 보니 데이트를 하는 젊은 남자들이
훗날을 대비하여 파트너와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좋은 사이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녹음형식으로
마련한다는 기괴한 소식도 들린다.
법의 작동이 이성이 아니라 감정적인 기분에 의해서
좌우될수록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양심은 사라지고
관계는 점점 단절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판관 포청천의 시대가 아니라 판관 엿장수의
시대를 산다는 생각이다.
관계결핍이란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생물학적인 단절을 부릅니다.
생물학적인 단절이란 가장 인간다운 뇌
사용방식이 가장 동물적 사용방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물학은 가장 건강한 "나"의 작용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다고 합니다.
상호작용이 결여된 "나"란 당분간 편리할 수 있지만
훗날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지만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심을 알아차리고 진심을
전달하는 능력을 터득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므로
고립과 단절에 익숙하게 됩니다.
관계를 만들고 싶어도 생물학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뇌회로가 고착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추정해서 쓴 글이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서
관찰하고 바라본 사실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관계결핍은 무서운 자아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나"란 상호작용하는 나아닌 것들과
조화와 균형으로 만들어지는 생물학입니다.